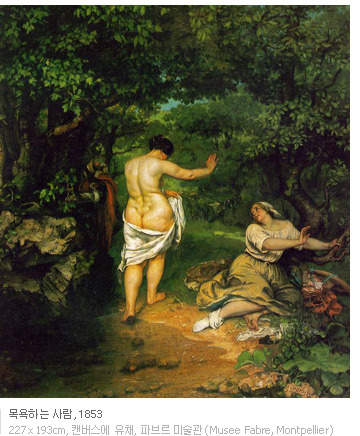|
이 그림의 특별한 점은 바로 ‘평범함’에 있다
오른쪽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등산복 차림을 하고, 언덕을 막 걸어 올라 더러워진 신발을 신은 채,
무식하게 긴 작대기를 짚고 있는 사람이 바로 쿠르베 자신이다.
왼쪽 중앙에 트랜디한 신사복을 입고, 저 멀리 지나가는 마차를 타고 막 도착해
흙이 묻지 않은 맵시있는 구두를 신은 채, 우아하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은
쿠르베의 후원자인 알프레드 브뤼야스(Alfred Bruyas, 1821~1877)다.
그의 오른쪽에는 고개 숙여 인사하는 하인이,
왼쪽에는 늠름한 개 한 마리가 양쪽에서 브뤼야스를 보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쿠르베가 그의 후원자 일행을 동네 언덕에서 우연히 만나
“안녕하세요. 쿠르베씨”라고 말하는 그들과 인사를 나눈다는 내용이다.
얼마나 특별한가. 이렇게도 ‘평범한’ 소재를 예술작품이라고 그린 것이…….
실제로 이 그림이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술계의 아카데미즘은
역사화, 종교화, 초상화, 풍경화, 풍속화 등의 규범화된 장르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쿠르베가 내놓은 이런 장르의 그림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평범함’ 뒤에는 화가 나름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잘 보라.
쿠르베는 허름한 등산복 차림에 무거운 화구통을 짊어지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
자신의 작품을 사주는 후원자를 만났어도 조금도 주눅 든 기색이 없다.
인사를 하면서도 턱수염은 치켜 올라가 거만할 정도로 당당해 보인다.
반면 부자 후원자는 모자를 벗으며 점잖게 인사를 건네고 있지만
좌우로 그를 지켜주는 사람 혹은 개를 대동해야만 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돈은 있으나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쿠르베는 이 그림에 “천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부(富)”라는 부제를 붙였다.
예술가는 돈은 없지만 천재적인 존재고,
그러니 돈 많은 부자들이 예술가를 후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