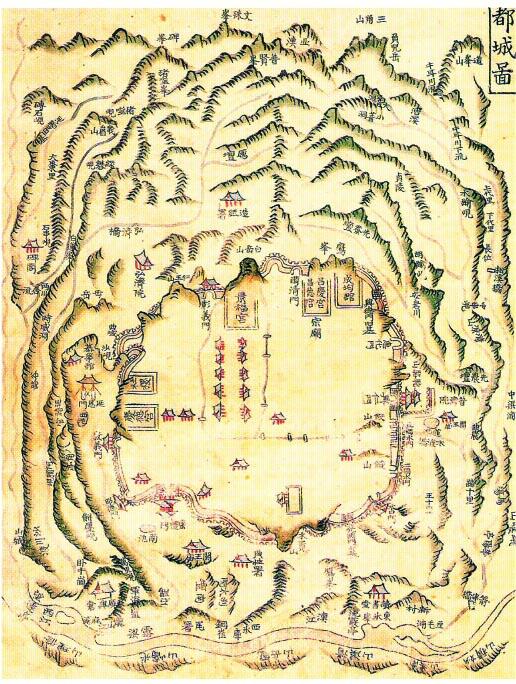1637년 1월3일, 도성으로부터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다.
12월 그믐과 정월 초하루, 몽골병들이 도성으로 몰려들어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약탈을 자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병자호란을 일으키기 전, 홍타이지는 휘하 장졸들에게 군기를 확립하고
함부로 약탈을 자행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시’일 뿐이었다.
더욱이 몽골병들은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청에 귀순했고, 또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었다.
군기를 강조하여 그들의 ‘욕구’를 언제까지고 묶어두기는 어려웠다.
자신들을 지켜 줄 군사도, 이끌어 줄 조정도 없는 상황에서
도성 백성들은 몽골병들의 분탕질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안쓰러웠지만 남한산성의 조정은 도성 사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
●칭신(稱臣) 여부를 둘러싼 고민
1월3일, 화친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한 조정은
당장 홍타이지의 ‘조유(詔諭)’에 회답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조유를 건네받는 자리에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거부하지 못한 이상,
조선은 이제 ‘오랑캐의 신하’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인조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신들을 불러모았다.
회답서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영의정 김류가 입을 열었다. ‘나라가 살아남은 뒤에야 명분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장차 무슨 명분을 논하겠습니까?’ 김류는 자신이 총대를 메겠다고 나섰다.
청에 대해 ‘칭신(稱臣)’하는 문제를 자신이 담당하여
‘천하 후세의 죄인’이 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김류가 울자 인조도 울기 시작했다.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 망극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남한산성에 들어온 뒤 벌써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인 인조였다.
숙부 광해군을 몰아내고 용상에 오를 적에만 해도, 아니 정묘호란 직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한 것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젠 오랑캐에게 신하를 칭하며 머리를 숙여야 할 판이었다. 눈물이 잦아질 만도 했다.
이홍주(李弘胄)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상 ‘대청황제(大淸皇帝)’라는 호칭을 써야 한다고 했다.
홍서봉은 한 걸음 더 나갔다. 지금 상황에서는 군부(君父)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
저들의 지적대로 요금원(遼金元) 시절의 고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들에게 신속(臣屬)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라는 주장이었다.
김신국은 두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선을 그었다.
그들에게 칭신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인조가 직접 홍타이지를 대면하게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30일, 인조가 성을 나가서 항복할 때까지
조선 조정이 끝까지 피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
|
장유(張維)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일단 ‘조유’에서 홍타이지가 질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하되,
‘칭신’ 여부는 그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이식(李植) 또한 ‘대청황제’라는 칭호는 그냥 사용하되 ‘칭신’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주장했다.
신료들은 답서의 서식(書式)과 시작하는 단어,
내용에 들어가는 글자 한 자 한 자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외로운 성에 갇혀 버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오랑캐’로 멸시해 온 여진족 추장에게 ‘칭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이었다. 논란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황제’임을 인정하다
고민과 논란 끝에 홍타이지에게 보내는 답서를 완성했다.
답서의 맨 앞에
‘조선국왕은 삼가 대청국관온인성황제(大淸國寬溫仁聖皇帝)께 올립니다.’라는 표현을 썼다.
조선에 보내는 서신을 ‘조유’ 운운하면서 ‘제국의 위엄’을 과시하려 했던 홍타이지와
청의 위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표현이었다.
답서는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소방(小邦)이 대국에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 병화(兵禍)를 불렀습니다.
특사(特使)를 보내 정성을 드리려 했으나 병과(兵戈)에 막혀 통할 길이 없었습니다.
황제께서 궁벽한 구석까지 오셨다는 소식에 의심과 믿음, 기쁨과 두려움이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봄의 일은 소방이 그 죄를 사과할 길이 없습니다.
소방 신민들의 식견이 얕고 좁아 대국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의 고민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절절히 담겨 있었다.
눈앞에 닥친 망국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되, 자존심을 최대한 살리려는 몸짓이었다.
‘조유’ 속에 넘쳐나는 홍타이지의 ‘질책’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사죄했다.
주목되는 것은 호칭이었다.
홍타이지를 ‘황제’라고 불렀지만 조선을 ‘소방’으로, 인조는 ‘조선국왕’이라 했다.
맨 마지막에는 의연히 숭정(崇禎) 연호를 사용했다.
‘조선 국왕 신(臣) 모(某)’란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써 ‘칭신’은 일단 거부했다.
또 청의 연호 대신 명의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명에 대한 충성 또한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았다.
답서의 뒷부분은 홍타이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죄가 있으면 치고, 죄를 뉘우치면 용서하는 것이 대국의 도리입니다.
정묘년의 맹약을 생각하고, 생령(生靈)을 불쌍히 여기시어
소방에게 새로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대국이 용서하지 않고
기어이 병력으로 추궁하려 한다면 소방은 스스로 죽음을 기약할 뿐입니다.’
개과천선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청의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홍서봉(洪瑞鳳), 김신국(金藎國), 이경직(李景稷)이 답서를 들고 다시 청 진영으로 갔다.
황제는 만나지 못했다. 답서를 접수한 마부대는 상의한 뒤에 회답을 주겠다고 했다.
●비변사의 독주에 대한 반발
상황에 밀려 화친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우선 비변사의 몇몇 신료들이 중심이 되어 비밀리에 화친을 추진하는 것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비변사 신료들은 과거 척화·주화 논쟁 때처럼 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여
적진에 보내는 문서의 초안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채 주고받았다.
‘인조실록’의 사평(史評)에는
승지와 사관(史官)이 보지 못하도록 소매에 넣어 출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이 상소했다.
‘우리는 참월(僭越)하게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는 오랑캐에 맞서
명나라를 대신하여 화란을 당하는 것’이니
‘의열(義烈)에 당당하고 해와 달에 비춰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의 국서를 태워버림으로써 장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화친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답서를 보낸 다음부터 삼사(三司)의 관원들은
다시 최명길(崔鳴吉) 등 비변사 당상들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최명길에 대해, 적의 세력을 과장하고 화친을 주도하면서 나라를 치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류에 대해, 하는 일 없이 겁만 많아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유백증(兪伯曾)은,
‘칭신’한다고 해서 포위가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며
나라를 그르친 김류와 윤방(尹昉) 등의 목을 베라고 외쳤다.
‘조유’에 대한 답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었다.
인조는 최명길 등을 감쌌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보였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신료들 사이의 논란을 다시 방치할 경우,
화친의 시도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637년 1월 초, 청과 조선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그것은 홍타이지의 ‘조유’와 조선의 답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조선의 ‘꿈’은 청과의 형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비록 홍타이지를 ‘황제’라고 불러주었지만 그를 ‘조선의 황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명목상 ‘홍타이지의 동생’이자 ‘조선국왕’으로 남아 명과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홍타이지는 ‘조선국왕’이란 표현 대신 ‘신(臣) 이종(李倧 · 인조의 이름)’을,
‘숭정’ 대신 자신들의 ‘숭덕(崇德)’ 연호를 원하고 있었다.
누구의 꿈이 실현될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
- 2008-08-1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