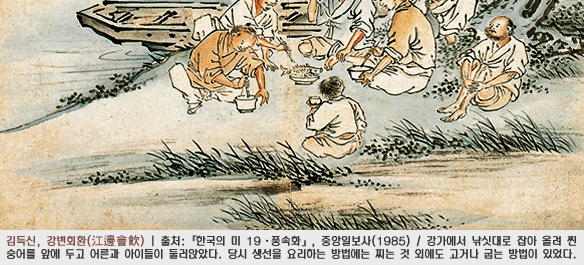|
김득신 '강변회음도'의 숨은 아이
어른들의 천렵에 아이는 왜 끼지 못했을까 천차만별 인물들 표정에 해학적인 서민의 삶 묻어나 | |
|
현대인에게 피서는 휴식으로 통한다.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놀고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데 피서의 의미가 있다.
이와 달리 선조들의 피서는 '수신(修身)'과 '보신(補身)'의 의미였다.
멀리 떠나기보다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더위를 피했다.
시원한 폭포를 관조하는 '관폭',
찬물에 발을 씻는 '탁족',
책을 접하며 더위를 잊는 '독서',
냇물이나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노는 '천렵',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는 '물맞이' 등으로 헐거워진 심신의 기운을 추슬렀다.
그런데 선비와 서민들의 피서법에는 차이가 있다.
선비들에게 피서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시원한 물과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되 수양도 겸한 것이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탁족'과 '독서'가 대표적 피서법이다.
반면에 서민들의 피서는 마음의 수양보다는 보신이 중심이었다.
쇠약해진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데 치중했다. '천렵'도 그중의 하나다.
천렵과 가마우지 낚시
그림을 보면, 바람이 시원한 강가에 물고기 한 마리를 중심으로
6명의 어른이 둘러 앉아 있다. 표정이 제각각이다.
그리고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이가 등장한다.
어른들은 물고기에 젓가락을 대는 사람, 살점을 입에 넣거나 탁주를 마시는 사람,
양념을 준비하는 사람, 한 쪽에서 다리를 모은 채 홀로 앉은 사람 등 이다.
이들 뒤로 정박해 있는 배에는 다섯 마리의 새가 대나무에 앉아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새들이 전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폼이다. 왜 그럴까?
검은색과 부리의 모양으로 봐서 새들은 어부가 기르는 가마우지 같다.
'물매'(물에 사는 매)라고도 불리는 가마우지는 예로부터 고기잡이 도구이기도 하다.
가마우지 낚시 방법은 간단하다. 가마우지의 목을 끈으로 묶은 뒤 강에 풀어둔다.
그러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되 삼키지는 못한다.
이때 부리에서 물고기를 꺼내면 된다.
지금 어른들이 먹고 있는 물고기도 가마우지 낚시로 잡은 것 같다.
아이는 왜 숨어 있을까? 뿐만 아니다. 그림에는 흥미로운 등장인물이 있다. 오른쪽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이다. 어른들의 시선이 물고기를 향해 있는데,
이 아이의 시선은 방향이 다르다.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의 어른이다.
누구일까? 그들은 어떤 관계일까? 아버지와 아들일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아이는 이 어른 때문에 나무 뒤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
역시 뒷모습으로 앉아 있는 맨 앞쪽의 아이다.
숨어 있는 아이와 동떨어진 어른, 그리고 뒷모습의 아이,
이들의 묘한 관계가 그림에 재미를 더한다.
게다가 그 재미는 두 그룹의 역학관계에서도 발생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림의 등장인물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다섯 명의 어른이고,
다른 하나는 숨은 아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어른과 아이다.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쪽은 흥겹고, 다른 한쪽은 심각하다.
이 이질적인 표정의 공존이 은근한 해학성을 부추긴다.
긍재는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과 더불어 조선 후기의 3대 풍속화가로 꼽힌다. 도둑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 한낮의 소동을 그린 '파적도'나
은밀히 투전을 즐기는 사람들의 '밀희투전'처럼
그림의 주특기는 일상을 생생하게 포착한 해학적인 풍속화였다.
'강변회음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웃음이 번지게 한다.
나무 뒤에서 아이가 펼치는 극적인 상황이 재미있다.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은 것일까?
아니면 천렵에서 소외된 아버지를 측은하게 엿보는 것일까?
선비들의 내면을 표현한 '탁족도'나 '독서도'와 달리,
이 그림은 긍재가 서민의 생활상을 스냅사진을 찍듯이 기록한 것이다.
서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었던 만큼
보양의 일환으로 천렵을 즐긴 셈이다.
현대인의 피서는 선조들의 피서법 중에서 긍재의 '강변회음도'에 가깝다.
마음의 단련보다는 몸을 생각하는 보양에 무게가 실려 있다.
- ㈜아트북스 대표, 정민영의 그림 속 작은 탐닉
- 2008.08.06 국제신문
| |
|
|
'느끼며(시,서,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0) | 2008.08.16 |
|---|---|
| 혜원 신윤복 - 사시장춘(四時長春) (0) | 2008.08.16 |
| 불화 - 지옥도(시왕도) (0) | 2008.08.09 |
| 글과 그림을 완성시키는 배첩 - 배첩장, 김표영 (0) | 2008.08.05 |
| 풍속화 - 짚신 삼기 (0) | 2008.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