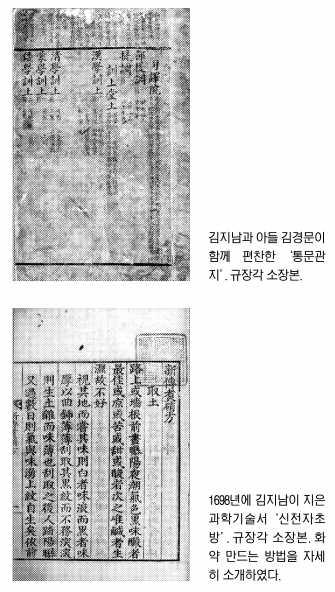(42)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역관, 김지남
4대가 같은 잡과에서 합격한 세전성(世傳性)은 의과, 음양과, 역과, 율과 순으로 강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보고 들어야 대물림하기 쉬웠으니, 책에 없는 비법은 핏줄로만 상속되었다.
세전성을 거꾸로 설명하면, 역과 출신은 다른 잡학도 연구하여 전공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역관 김지남이다.
|
● 외교사 자료집 ‘통문관지´를 아들과 함께 편찬
김지남(金指南 · 1654∼1718)은
호조 주사(籌士) 김여의와 전의감정(典醫監正) 이몽룡의 딸 사이에 태어나 역관이 되었다.
주학(籌學) 집안과 의학 집안이 만나 역학을 전공한 아들을 키운 것이다.
18세에 급제하여 28세 되던 1682년에 일본에 다녀왔다.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가 장군직을 물려받자 축하사절로 파견되었는데,
6개월 동안 1만 1000리 먼 길을 여행했으며, 사행일지인 ‘동사일록(東日錄)’을 기록했다.
그 해에 청나라까지 다녀왔으니, 지남(指南)이라는 이름 그대로 길에서 나그네로 한 해를 보냈다.
환갑이 넘도록 중국에 자주 드나들며 유창한 중국어로 외교상의 문제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하였다.
1710년에 정재륜을 따라 북경에 갔을 때 우연히 심양의 장수 송주와 며칠 동안 이야기했는데,
우리 나라가 제후의 법도를 잘 지킨다는 사실을 많이 말했다.
나중에 송주가 재상이 되자 그러한 사실을 황제에게 직접 아뢰어,
황제가 조선에서 바칠 공물을 줄여 주었다. 국가 재정이 그만큼 절약된 셈이다.
김지남이 역관으로 활동하며 남긴 업적은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외교사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는 ‘통문관지’를 편찬한 사실이다.
이 책의 공동 편찬자인 아들 김경문은 서문에서 편찬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인접한 중국 · 요(遼) · 연(燕) · 여진 · 일본 등과
어려운 문제를 타결한 법례가 많았지만, 이를 수록한 문헌이 없다.
그래서 고증할 길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영의정 최석정이 사역원 제조로 있을 때에
김지남이 전고(典故)에 밝다는 사실을 알고, 외교 고사를 수집 정리하여 편찬하게 하였다.”
이 책에는 사역원의 관제, 역과(譯科), 여로(旅路), 출장비부터 중국과 일본에 보내는 외교문서나
접대하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역관들이 알아야 할 모든 항목이 설명되어 있고,
대표적인 선배 역관들의 간단한 전기도 실려 있다.
12권 6책의 방대한 분량인데, 후배 역관들이 비용을 갹출하여 출판하였다.
조선시대에 17회나 재판을 찍을 정도로 많이 읽히고 참고가 된 책이다.
김지남은 역관 박정시의 딸과 혼인하여 7남 3녀를 낳았는데,
그 가운데 아들 5형제가 모두 역과에 급제했다.
이창현이 편찬한 ‘성원록´에는
경문(慶門) · 현문(顯門) · 순문(舜門) · 유문(裕門) · 찬문(纘門)의 가계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소개되어,
대표적인 역관 집안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 화약 만드는 법을 연구하고 책까지 쓰다
김지남은 한 사람의 역관으로 편하게 살지 않고,
중국어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
정묘호란 뒤에 청나라와 싸우기 위해 화약이 많이 필요해지자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우선 흑색화약의 원료인 유황과 염초를 많이 만들어야 했다.
김양수 교수는 ‘조선후기 전문직 중인의 과학기술활동’이라는 논문에서
1635년에 이서(李曙)가 편찬한 ‘신전자취염초방(新傳煮取焰硝方)’의 염초 제조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가마 밑의 흙과 미리 준비해둔 재 · 오줌 등을 화합했는데,
뇨분 속에 있는 질산암모늄과 재 속에 있는 탄산칼륨을 반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려면 가마를 때기 위해 막대한 나무가 필요했다.
김지남이 개량한 제조법은 나무 대신에 일년생 잡초를 써서 비용이 줄어들고 품질은 더 좋아졌다.
1692년에 부사로 연행 길에 오른 민취도가 김지남에게 염초 제조법을 알아보라고 하자,
요양의 어느 시골집에 찾아들어가 사례금을 주고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주인이 죽어 비법을 익히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화약 만드는 것을 국법으로 엄하게 금했으므로, 목숨을 걸고 배워야 했다.
조선이 비록 항복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가상 적국이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실험 끝에 성공했으며,
1698년에 그 방법을 책으로 써서 출판한 것이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이다.
화약 만드는 여덟 가지 과정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요약하였다.
“먼저 흙을 모으고(取土) 재를 받아서(取灰) 같은 부피의 비율로 섞는다(交合).
섞은 원료를 항아리 안에 펴고 물을 위에 부어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篩水) 가마에 넣고 달인다(熬水).
이 물을 식혀서 모초(毛硝)를 얻고 이 모초를 물에 녹여 다시 달여서(再煉) 정제시킨다.
재련 후에도 완전히 정제되지 않았으면 또 한번 달인다(三煉).
이렇게 얻은 정초(精硝)를 버드나무 재, 유황가루와 섞어서 쌀 씻은 맑은 뜨물로 반죽하여
방아에 넣고 찧는다(合製).”
이렇게 만든 화약은 땅 밑에 10년을 두어도 습기에 변질되지 않고,
흙과 재도 예전의 3분의1밖에 들지 않아 자주 국방과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장인들이 읽기 쉽도록 한글로 언해하였다.
1796년에도 다시 출판했으니, 오랫동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백두산 기행일기 ‘북정록´ 남겨
|
김지남은 한국사에 여러 차례 이름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에 역관으로 참여한 사실이다.
백두산은 지형이 험해 조선 쪽에도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으며,
청나라에서는 황실의 근본이라고 해서 아무도 살지 못하게 했다.
원나라를 세운 몽골족이 결국 중원과 북경을 포기하고 몽골로 돌아간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이다.
피차간에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 국경선이 엄격하게 없었다.
1692년에 청나라에서 백두산을 조사하며 조선 측에 길을 안내하라고 했는데,
길이 없다고 핑계를 대어 무마하였다.
1710년에 우리 백성이 국경을 넘어가 살인하자 청나라에서 조사관이 나왔는데,
김지남이 추운 겨울날 길을 안내하지 않고 열흘이나 버텨 유야무야되었다.
그러나 1712년 2월24일에 청나라에서 자문(咨文)이 왔는데,
얼음이 녹으면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 국경을 조사할테니, 조선 측에서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은 수십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2월15일에 이미 북경을 떠난 상태였다.
조정에서는 박권(朴權)을 접반사로, 김지남을 수역(首譯)으로 임명하였다.
김지남은 아들 김경문을 데리고 갔다.
이들은 혜산을 출발하여 오시천, 서수라, 화덕, 지당을 거쳐 박봉곶에 도착하여
압록강 근원을 조사하였다. 백두산 천지에 이르러 확인한 다음, 분수령에 내려와 정계비를 세웠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으므로 밀림과 벼랑, 강줄기 사이로 말 타고 갈 수 있게
길을 닦는 것만도 큰 일이었다.
천지 가까이 오자 목극등은 노인이라는 핑계를 대며 박권과 김지남을 떼어내려고 애썼다.
5월6일에 백두산 등반 인원이 확정되었는데,
59세 되던 김지남은 끝까지 우겨 따라가게 허락받고,
55세 되던 박권은 결국 오르지 않기로 했다.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가 정계비(定界碑)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책임자 양반은 빠지고 역관 김지남이 목극등과 대담하며 모든 일을 진행하였다.
백두산을 오가며 세 사람이 모두 기행일기를 썼는데,
김지남의 ‘북정록’이 박권의 ‘북정일기’나 김경남의 ‘백두산기’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훌륭하다.
박권의 기행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던 것이다. 양반 관원은 중도에 포기했지만,
전문가는 끝까지 따라가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토문(東爲土門)’의 증인이 되었다.
비록 정계비를 세웠지만, 나라가 약해지면서 국경도 없어졌다.
조선통감부를 설치해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에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겼다.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정계비마저 없앴다.
최근에 한국 연구자들이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4㎞ 떨어진 곳에 남아 있는
정계비의 받침돌을 발견하였다.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김지남같이 책임있는 전문지식인을 다시 생각해 본다.
- 허경진 연세대 국문과 교수
- 서울신문, 2007-10-15
'지켜(연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선후기 신지식인 한양의 中人들] 피재길 - 고약장수에서 종6품으로 (0) | 2008.03.17 |
|---|---|
| [조선후기 신지식인 한양의 中人들] 유상 - 마마 전문치료 두의(痘醫) (0) | 2008.03.12 |
| [조선후기 신지식인 한양의 中人들] 변승업 - 조선 최고의 부자 역관 (0) | 2008.03.12 |
| [조선후기 신지식인 한양의 中人들] 역관의 어려움 (0) | 2008.03.12 |
| [조선후기 신지식인 한양의 中人들] 세계일주에 나선 역관들 (0) | 2008.03.12 |